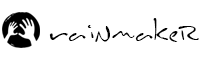김성근 감독은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하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한다. 12시쯤 식사가 차려지지만 언제 먹으란 소리가 없다. 김 감독이 맡은 팀이 스프링 캠프를 떠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사가 바로 “선수들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잊을 정도”다.
그러나 김 감독이 아끼지 않는 시간이 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1시간 씩 치러지는 미팅이 그것이다. 휴식일 전날을 빼곤 매일같이 일종의 정신교육이 이루어 진다.

오키나와 전지훈련 첫날 양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 |
명 투수 출신 한 해설위원은 이를 두고 “프로 선수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비난은 미팅의 효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나온 것이다.
김 감독은 그 시간을 통해 ‘어떻게’가 아닌 ‘왜’를 가르친다. 내가 왜 야구를 해야하는지,왜 이렇게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시간은 항상 선수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선수들은 “너에게 야구란 무엇이냐” , “어떤 각오로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목표는 무엇인가” 등의 항목에 답해야 한다.
김 감독은 이것을 “약속”이라고 표현했다. 감독과 선수간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김 감독은 말한다. “야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거의 모든 선수들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 그건 내가 듣고 싶어 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말이다. 글은 자기 스스로의 다짐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야구라면 전부를 놓고 달려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후 김 감독은 자신의 경험과 책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선수들에게 전해준다. 옛 중국의 명언부터 성공한 기업인들의 철학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들려준다.
이를 위해 많은 책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책과 가까이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야구 선수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대신 알려주기 위해서다. 야구 얘기를 먼저 꺼낼때 보다 인생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모든 훈련을 지휘하고 훈련 계획을 짜는 것 만으로도 짧은 것이 김 감독의 하루다. 여기에 책까지 꼼꼼히 읽으려면 그나마도 부족한 잠을 더 포기해야 하지만 김 감독은 적지 않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한다.
지난 2000년 말 LG 2군 감독에 취임했을 때 일이다. 당시 김 감독은 2군 선수들을 이끌고 제주도 전지훈련을 떠났다. 물론 매일 미팅이 이어졌다.
하루는 칠판에 '一球二無' 한자를 큼지막하게 썼다. 야구에서 '다음' 없다는 그의 인생 철학이 담긴 말이다.
김 감독은 말했다. “너희들이 1군에 올라갔을때를 가정해보자. 어쩌다 대타를 나가게 됐다. 낯선 환경과 많은 관중, 떨릴 수 밖에 없다. 그때 상대 실투 하나를 놓치게 되면 그 타석은 끝이다. 거기서 못치면 또 2군이다. 또 언제 올라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안타를 치느냐 못 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것 저것 생각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반응해야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하루에도 수천번씩 스윙을 하며 몸에 익혀둬야 그럴때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아진다.”
당시 선수들 속엔 현재 LG 주전 유격수인 권용관도 있었다. 그는 2000시즌이 끝난 뒤 방출 선수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 감독은 권용관의 가능성을 믿고 그를 지켰다.
모든 스프링캠프가 끝나고 시범경기가 열리기 전 진주 연암대학 야구장에서 1,2군 연습 경기가 있었다. 구단주 생가가 있는 진주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있던 경기다. 사실 누구도 그 경기의 승패엔 별 관심이 없었다. 그해에도 김재현의 투런 홈런(투수 이승호)에 힘입은 1군이 역전승을 거뒀다.
아무렇지도 않게 모두가 짐을 싸고 있을 때 김 감독이 권용관을 불러세웠다. 그리고는 1시간이 넘도록 수비 훈련을 시켰다. 일명 ‘아메리칸 펑고’를 직접 쳤다. 몸을 최대한 뻗으며 날려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공을 좌,우로 계속 쳐댔다.
권용관은 이날 별다른 실수가 없었다. 그러나 긴장한 탓에 평상시의 수비범위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당시 LG 유격수는 유지현이었다. 김 감독은 적어도 유격수 수비에서만은 권용관이 유지현을 넘어섰다고 믿고 있었다. 그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권용관은 지난 겨울 언 땅을 온 몸으로 녹여내야 했다.
김 감독은 그렇게 땀을 흘리고도 정작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에선 움츠려들고 만 제자가 안타까웠던 것이다. 권용관은 아직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진짜 야구선수가 된 시간”이라고 당시를 떠올린다.
2007년 SK 스프링캠프서도 물론 ‘김성근표 미팅’은 계속됐다. 가득염 조웅천 등 고참 선수들마저도 “야구를 떠나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라며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아니다. 뒷자리에 앉아 듣는 둥 마는 둥 시간을 보내는 선수들도 있다.
김 감독은 굳이 그런 선수들을 불러내 꾸짖지 않는다. 김 감독은 “리더는 방향설정을 해주는 거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선수들에게도 “기회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잡는 것”이라고 강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받아들이지 않는 선수를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받아들인 선수들의 변화가 그들을 바꿔놓는다.
고른 경쟁 분위기 속에서의 엄청난 훈련량은 곧 기술의 진보로 이어진다. 흔히 프로선수의 기량차는 백짓장 한 장이라고들 한다. 여기에 김 감독 특유의 평등주의는 맘 놓고 있던 기존 선수들에게 큰 자극이 된다. 늘 한수 아래로 여겼던 선수들이 어느새 자신을 추월하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SK 한 선수는 매년 12월 가족들과 해외로 나가 개인 훈련을 해왔다. 게을리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이다보니 훈련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마무리 캠프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말 이 선수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올해는 못간다. 예약한거 다 취소해라”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때 가족들과 지내면 당장 내 자리가 없어질 것만 같았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눈에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도저히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o t h e r 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성근 장인 리더십-1회말] 모자람을 감추려하지 말라 (0) | 2009.01.15 |
|---|---|
| [박동희의 야구탐사] ‘슬픈 전설’, 재일동포 야구단 [4]편 (0) | 2009.01.15 |
| [박동희의 야구탐사] ‘슬픈 전설’, 재일동포 야구단 [3]편 (0) | 2009.01.15 |